실시간 뉴스
- 미네소타 간판 바이런 벅스턴, WBC 미국 야구대표팀 승선
- 카리나, 올백 스타일의 정석 [IS하이컷]
- 카리나, 두상미녀는 오늘도 열일 중 [AI 포토컷]
- 안보현·이주빈, 본격 ‘썸’ 시작... 시청률 5.4%로 자체 최고 (스프링 피버)
- ‘하트맨’ 권상우·문채원, 유재석 ‘속뒤집개’ 됐다
- ‘크라임씬’ 넷플릭스서 또 본다…새 시즌 제작 확정 [공식]
- ‘지미 팰런쇼’ 이어 ‘투데이 쇼’까지…안효섭, 美 메인스트림 접수
- 구교환 해냈다…‘만약에 우리’, 개봉 13일째 손익 돌파
- 브레그먼 빠진 MLB 스토브리그...다저스·메츠·블루제이스, '최대어' 터커 영입 경쟁
- AI 덕후들도 '엄지척'…힘 실리는 SKT 초거대 AI
무비위크
[인터뷰②] 박은경 대표 "故힌츠페터 독일 첫만남, 태극기 걸어두고 환영"
등록2017.10.02 11:00

1000만 영화 한 편의 위력은 대단하다. 영화 '실미도(강우석 감독·2003) 이후 약 14년간 스무 편의 영화가 1000만 돌파 달성에 성공했고, 이전보다 빠르게, 그 빈도 역시 잦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1000만은 많은 영화인들의 꿈이고, 몇 년, 몇 십년이 지나도 회자될 기록의 산물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흐름에 따라 '무조건 1000만', '벌써 1000만'이라 쉽게 표현되지만 여전히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은 아니다. 관객들의 신뢰를 담보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꿈의 숫자다. '하늘이 점지해 주는 1000만'이라는 수식어도 유효하다.
올해 그 복을 한 몸에 받은 작품은 바로 '택시운전사(장훈 감독)'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이들이 아닌 이를 바라보는 제 3자의 시각으로 색다르게 풀어내며 관객들과 소통하는데 성공했다. 관객들이 원한 1000만이다. 1000만이라는 결과만큼 기억될 과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영화계는 '택시운전사' 제작사 더 램프 박은경 대표를 빼놓고는 말 할 수 없다. 박은경 대표는 서강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으로 제일기획, IBM을 거쳐 2003년부터 쇼박스에서 일하며 본격적으로 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마케팅팀장과 투자팀장을 지낸 그는 2012년 독립해 제작사 더 램프를 차렸고, '동창생(2013)'을 시작으로 '쓰리썸머나잇(2014)', '해어화(2015)'에 이어 '택시운전사'를 제작, 4년 만에 1000만 영화를 탄생시킨 능력자가 됐다.
"1년쯤 지나면 좀 실감이 날까요?"라며 '100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직까지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고백한 박은경 대표는 "이번 영화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영화인으로서 관객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함께 한 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다"고 진심을 표했다.
결국 기승전'사람'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기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에 공감과 소통의 최고치를 찍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만들 수 있었다. 관객들의 애정에 보답할 길은 다시 돌아 영화다. 박은경 대표는 쉴틈없이 차기작 '말모이(가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조선어학회의 이야기를 다룬다.
※인터뷰①에서 이어집니다.

- 故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의 첫 만남은 어땠나.
"직접 뵙기 전 관련 이야기가 영화화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다. 그랬더니 우리 회사와 나에 대해 먼저 궁금해 하시더라. 원래 제작사들은 홈페이지가 잘 없지 않나. 찾아 보셨는지 '왜 홈페이지가 없냐'는 질문이 돌아왔고, 영화보다 나에 대해 먼저 설명 드렸다. '전 그 동안 이런 영화를 했고, 어디 어디에서 근무했고, 제작사는 어떤 곳이며, 배급사는….'(웃음) 상세하게 알려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하셨다.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극영화로 만든다고 하니까 더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다."
- 이후 직접 만남을 위해 독일로 간 것인가.
"맞다. 찾이 뵐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날짜를 조율했고, 갔을 땐 너무 크게 환대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다. 기자님 집이 호수가에 있는데 찾기 쉬우라고 저 멀리 태극기를 걸어 두셨더라. 엄청 아름다운 호수마을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마음이 뭉크했다.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이 웃으면서 안아 주시고, 사과 파이도 만들어 주시는데 꼭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맛 보는 느김이었다. 그 만큼 아늑했고 좋았다."
- 완성된 영화를 못 보고 떠나신 것이 아쉽긴 하다.
"자주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현실감이 없었다. '사실이 아닐거야' 싶었는데 다시 만난 곳은 장례식장이 됐다. 살아 생전 '택시운전사'에 대해 '광주 시민 분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 '이 분을 위한, 이 분의 마음을 위한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더 다짐하게 된 순간이었다."
- 만났을 땐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기자도 주인공이지만 우리 영화는 영화의 제목처럼 택시운전사 즉 만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날의 모습이다. 일종의 익스큐즈가 필요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니 기자님 역시 훨씬 더 좋아해 주셨고, '굿 스토리다'는 말씀도 해 주셨다. 돌아가실 땐 유산도 다 기부 하셨다고 하더라. 대단한 분이다."
-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자님을 보면서도 느꼈다.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좋은 어른이 되는 것, 잘 늙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 어떻게 젊게 사는지, 건강하게 사는지에 대한 화두들은 많다. 하지만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다. 정답은 없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다."

- '택시운전사'는 영화의 방향성에 대한 호평도 많았다.
"'관객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광주에 가 보면 어떨까, 함께 달리면 어떨까'라는 포인트가 가장 컸다. 서울에 있는 기사가 기자를 데리고, 관객들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송강호 선배였기 때문에 관객들을 택시에 태우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촬영 때도 느꼈지만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와, 선배님이 정말 많은 것을 해 주셨구나. 배우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 송강호라서 가장 좋았던 지점은 무엇이었나.
"시나리오에서는 다소 보수적이었던, 그렇기만 아저씨가 송강호라는 배우로 인해 러블리하게 바꼈다. 웃고 울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아저씨가 됐다. 경계없는 친근함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더 빨리 빠져들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다. 배우 송강호의 힘은 거대하다."
- 직접 만난 송강호는 어땠나.
"'쇼박스'에 다닐 때 '괴물' 마케팅을 하면서 잠깐 뵐 수 있었고, '의형제'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뵀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 거의 전 회차를 다 봤으니까. 배우로서 훌륭한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정말 재미있는 분이다. 본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를 보고 조·단역을 아우르면서 스태프들까지 챙기는 모습에서 제작자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일종의 제작자의 특권으로 현장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배우 송강호를 지켜볼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웃음)"
- 행복한 경험으로 남겠다.
"어느 날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도 지금 이 순간, 이 때가 내 인생에서 좋았던 시기로 기억될 것 같다.' 대부분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미래의 나를 떠올리고 있더라. 송 선배는 본질을 꿰뚫고 오로지 영화만 생각하는 분이다. 더도 없고 덜도 없다. 그래서 현장 사람들이 편할 수 밖에 없다."
- 평소 어떤 배우와 함께 하고 싶다고 염두해 두는 편인가.
"그렇지는 않다. 배우를 먼저 보는 스타일은 아니다. 최대한 캐릭터와 적합한 배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주연 뿐만 아니라 조·단역 배우들까지. 캐스팅 고민은 이제 습관이자 버릇이 됐다.(웃음) 그리고 나와 함께 했든, 하지 않았든 '이 분 잘 되겠다' 싶으면 여지없이 잘 되더라."
- 특별출연 엄태구 역시 주연 이상으로 회자됐다.
"(엄)태구 씨는 미쟝센단편영화제 작품을 통해 처음 봤다. '숲'이라는 단편이었는데 그 때 주인공이 엄태구와 류혜영 씨였다. 태구 씨는 '택시운전사' 이전에 '동창생', 혜영 씨는 '해어화'를 통해 만났다.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배우들은 늘 응원하게 된다.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 ③에서 계속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ins.com
사진= 김민규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마켓인]MBK 운명의 날…1조원대 분식·사기회생 공방 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0331.800x.0B.jpg)
![[마켓인]MBK 운명의 날…1조원대 분식·사기회생 공방 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1300330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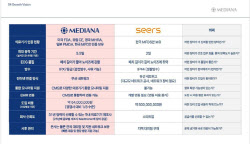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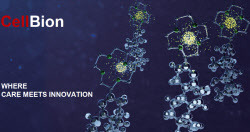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순간 모인 훈남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7.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어두운 무대에서도 빛이 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6.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멋짐 가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4.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무대를 부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5.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중독성 강한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2.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파워풀한 동작에 빠져들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8.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신나는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3.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다같이 손들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1.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딱딱 맞는 군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0.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칼군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9.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무대 장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8.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스웨그 가득한 동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3.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