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위크
"황금종려상, 새 출발" '뉴스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칸 그후[종합]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와 칸 영화제 그 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봉준호 감독은 6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나눴다. 지난 2017년 6월 '옥자' 개봉 당시 출연한 이후 2년 만에 손 앵커와 재회한 것. 2년 전에는 넷플릭스 영화인 '옥자'의 칸 영화제 출품 이슈로 대화했던 두 사람은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봉준호 감독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생충'을) 한 번 극장에 가서 (일반 관객들과) 봤다. 간단한 변장 방법이 있다. 전혀 못 알아보신다. 요즘 지하철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특별난 생김새가 없다. 헤어스타일만 잘 감추면 된다"는 재치 있는 말로 대담을 시작했다. '기생충'을 이상한 영화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묻자 "흔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 흔히 말하는 이야기의 틀이 있다. 그런 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 우리 현실에서의 삶은 거칠게 일반화시키기 힘들다. 악당으로서의 부자,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갑질을 한다든가 하는 부자가 있고, 이에 맞서 돈 없고 힘 없는 이들이 연대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기생충'은 복잡 미묘하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복잡한 레이어가 겹쳐 있다. 그래서 우리 현실과 잘 맞닿아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극중 냄새가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냄새를 맡으려면 보통 밀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동선을 보면 겹치지 않는다. 항상 공간적으로 나눠진다"면서 "이 영화는 최우식이 부잣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틈의 가까운 거리에서 아슬아슬한 선을 지킨다. 냄새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담겼다. 인간에게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붕괴되는 순간을 다루고 있다. 민감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언론이 봉 감독의 작품을 설명할 때 쓰는 '삑사리의 예술'이라는 표현도 언급했다. 봉 감독은 "헛발질을 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 요소들이다. 영화가 시작된 지 1시간 10분 이후 벌어진 일들, 그것이 거대한 삑사리의 모멘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스토리 흐름 자체가, 거창하게 말하자면, 삑사리의 예술이다.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섬세한 연출로 봉테일(봉준호+디테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봉준호 감독. "부담스럽다. 별명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뭔가 옥의 티가 있나, 봉테일이라고 하는데 오류가 있지 않나'를 보게 되지 않나. 영화가 정교한 것은 좋은 미덕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나. 과감성과 의외성을 추구하는데, 봉테일이라는 잣대로만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갑갑하고 두렵다"고 밝혔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영화 감독인 그는 트로피를 품에 안고 귀국한 다음날에도 여전히 시나리오를 썼다. 이에 대해 "상 받은 당일에는 맘껏 즐겼다. 그게 다였다. 다음날 귀국하면서부터 바로 시나리오를 썼다. 다음 작품 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무척 공포스러운 사건을 다룬 작품과 미국 영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좋은 영화를 또 보여달라"는 손 앵커의 말에 봉 감독은 "아직 왕관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왕관을 10년 후이건 20년 후이건 진짜 써볼 날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6.06 2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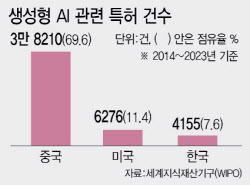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순간 모인 훈남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7.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어두운 무대에서도 빛이 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6.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멋짐 가득](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4.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무대를 부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5.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중독성 강한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2.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파워풀한 동작에 빠져들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8.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신나는 무대](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3.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다같이 손들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1.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딱딱 맞는 군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80.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칼군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9.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무대 장인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8.400x280.0.jpg)
![[포토] 알파드라이브원, 스웨그 가득한 동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2/isp20260112000273.400x28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