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정일모, ‘조폭 두목’→배우 재기했지만…“이혼 3번, 아들과 절연” (특종세상)
- K팝 인기 남가수, 2022년생 혼외자 존재…”금전적 지원”
- '여자축구 대표팀 비즈니스석 요구?' 지소연, "단순 편의 아닌 최소한의 처우 나아지기 바란 것"
- 이서준, 7년 연인과 결혼…‘절친’ 이상이 “남창희와 같은 날” 재조명
- 흥행 질주‘왕사남’, 설연휴 평균 46만명씩 추가…李 관람 효과도 ‘톡톡’ [왓IS]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 황희찬 누나 황희정, 입 열었다…“단연코 갑질 없어, 악의적 음해 법적 조치” [전문]
- MBC, 尹 1심 무기징역에.. 오늘(19일) ‘100분 토론’ 긴급 편성 [왓IS]
- 일본의 차세대 MCN ‘나하토’, 한국 PICK&COLONY(서이코퍼레이션)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 결승 안 뛴 이소연, 먼저 시상대 올라간 감동의 이유는? [2026 밀라노]
축구
상주가 1년 반 만에 새 잔디 깐 까닭
등록2011.03.31 09:30

K-리그 상주 상무 홈 구장 상주시민운동장에 새 잔디가 깔리고 있다.
잔디를 교체한 지 1년 6개월 만에 재교체다. 그 이유는 K-리그 경기를 치르는데 적합하지 않은 잔디가 깔려있어서다. 상주시민운동장은 2009년 가을 잔디를 교체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4계절용 잔디가 아니었다. 여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겨울에는 죽어버리는 한국형 잔디였다. 게다가 잔디를 새로 깐 뒤 단 한차례도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없다.
지난해 여름에는 잔디 위에서 군사 훈련까지 했다. 1만명 정도의 현역·전역 군인이 한꺼번에 경기장에 와 경기장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잔디는 군화로 무참히 짓밟혔다. 탱크까지 경기장 안에 들어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또 지난해 겨울에는 잔디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불로 태우기까지 했다. 상주시가 K-리그 축구팀을 유치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서다. 이재철 상주 단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주시민운동장에서 K-리그 경기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경기장은 축구 경기보다는 지역 행사가 열리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개막전에서는 다 죽은 노란 잔디와 모래가 반반 섞여 있어 보기 흉했다. 허정무 인천 감독도 "최악의 경기장 상태"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상주 선수들마저도 노란 잔디를 보고 깜짝 놀랐다. 1만 6000명의 만원 관중과 뜨거운 열기 사이에 '옥의티'였다.
상주시는 곧바로 잔디 교체에 들어갔다. 5억 원을 들여 4계절용 잔디를 깔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2cm 두께의 잔디를 깔지만, 짧은 기간 동안 잔디를 안정시키기 위해 4cm 두께를 선택했다. 공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과 홈 경기도 후반기로 미뤘다. 16일 대전과 홈 경기까지 최상의 잔디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계획이다. 한 달 반 만의 홈 경기인 셈이다.
최근 구단 측에는 운동장 사정을 모르는 상주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이제 상주에서 K-리그 경기는 안 할 거냐"며 항의한다. 하지만 잔디 교체에 대해 설명하면 이내 목소리를 낮춘다. 상주 시민들은 푸른 잔디에서 뛰는 선수들을 볼 수 있는 16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상주=김환 기자 [hwan2@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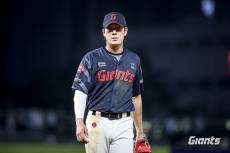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저속노화' 정희원과 법정공방 A씨, 스토킹·주거침입 혐의로 검찰 송치[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901176T.jpg)










![[포토]이미숙, 등장부터 근사하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5.400x280.0.jpg)
![[포토]이미숙, 반가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4.400x280.0.jpg)
![[포토]강석우, 꽃할배의 러블리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3.400x280.0.jpg)
![[포토]강석우, 첫 하트포즈입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2.400x280.0.jpg)
![[포토]한지현, 둘째딸도 사랑해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300.400x280.0.jpg)
![[포토]오예주, 막내의 사랑스러운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9.400x280.0.jpg)
![[포토]오예주, 발랄하고 풋풋하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6.400x280.0.jpg)
![[포토]'찬란한 너의 계절에' 화기애애한 제작발표회 현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5.400x280.0.jpg)
![[포토]강석우, 따뜻함 묻어나는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4.400x280.0.jpg)
![[포토]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미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3.400x280.0.jpg)
![[포토]채종협, 찬에겐 멜로라기보단 성장드라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1.400x280.0.jpg)
![[포토]이성경-채종협, 여러분의 봄을 책임질게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9/isp20260219000290.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