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개콘’ 떠난 개그맨 이덕재, 4금융 8억 빚+이혼…“전단지도 돌려”
- [왓IS] 박나래, 아직 1인 기획사 등록 못 했다... “ 母, 목포에 있는 등 여건 어려워”
- [속보] '카보타지 룰'이 뭐길래? 박해민 등 LG 11명, 캠프 출국 일정 변경
- 핵심선수 부상 보고 ‘탄식’한 사령탑…“햄스트링이다”
- ‘유럽 클럽 대항전 격돌’…UEFA 유로파리그 대상 프로토 승부식 10회차 발매 개시
- 차은우 측 “200억 대 탈세 의혹, 적극 소명할 것… 확정된 사안 아냐” [종합]
- 롯데 자이언츠, 2026 시즌 스프링캠프 돌입...신인 박정민+외국인 4명 합류
- [오피셜] PSG 이강인, 곧 복귀한다…현지 매체 “큰 힘이 될 것”
- 초대형 빅딜 성사! 메츠, 밀워키 에이스 페랄타 트레이드 영입→선발 마운드 대폭 보강
-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판타지오 측 “확정된 사안 아냐” 해명 [전문]
무비위크
[인터뷰①] 윤여정 "성매매 연기에 우울증…소리지르며 촬영"
등록2016.10.13 09:58

영화 '죽여주는 여자'(이재용 감독)가 개봉 5일 만에 5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례적으로 중장년층 관객들이 관람 열풍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인 성매매, 안락사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뤘음에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노련한 연기력으로 공감대를 높인 '죽여주는 배우' 윤여정(70)이 있다.
이재용 감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덜컥 출연을 결정했다. 다만 '알고싶지 않았던 현실'을 맞닥 뜨리고 일명 '박카스 할머니'라 불리는 캐릭터를 직접 연기하면서 우울증을 앓았다. 툴툴거리며 거침없는 입담을 뽐내기로는 충무로 1인자.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과 소녀감성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죽여주는 영화'를 선택했다.
"한 친구는 제목을 보자마자 '더럽다'고 했다. '나 이거 할거야' 했더니 제목만 보고 '하지마. 곱게 늙어야지 주접떨면 안돼. 제목이 그게 뭐야?'라면서 엄청 뭐라고 했다."
-완성된 영화는 아직 못 본 것인가.
"일부러 VIP시사회에 초대했다. '잘 만들었어. 잘 봤어'라고 하더라. 내가 '이제 인터뷰도 해야 하고 엄청 바빠. 아주 죽겠다'고 툴툴 거렸더니 '그런 말 하지마. 가치있는 일을 했으니까 인터뷰도 하고 이재용 감독 응원해줘'라면서 날 다독여줬다."
-내심 기뻤겠다.
"난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쭉 내비치는 사람보다 말을 바꾸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좋다. 그 친구의 응원이 가장 좋았다."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내가 바보다. 바보 같았다. 시나리오를 보고 '에이 뭐 이걸 진짜 일일이 시키겠냐'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냥 스케치 정도로만 따지 않을까 싶었는데 늘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렇게 속았으면서 또 속고 살아. 신기하다. 인간이니까 그렇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끌렸나.
"이재용 감독에 대한 신뢰가 가장 컸다. 처음 보는 감독이 이 소재의 시나리오를 들고 왔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궁금했다. 세상에 아주 없는 이야기가 영화화 되지는 않는다. 자극적이고 독단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믿었던 이재용 감독이 힘든 연기를 요구한 것인가.
"처음엔 하라는대로 했다. 근데 끊임없이 디테일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 세 번까지 하고는 정말 죽겠어서 소리를 지른 기억이 난다. 이미 열이 나서 의견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재용 감독은 나중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 근데 소리를 질렀더니 시키는 것을 멈췄다. 진작 지를껄 그랬다.(웃음)"
-'돈의 맛' 때와 비교한다면?
"'죽여주는 여자'가 정신적으로 훨씬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임상수 감독을 만나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 땐 그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죽여주는 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 사람은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지 아니까 원 테이크로 갔거든."
-알고싶지 않은 이야기를 알게 됐다고 했다.
"노인 성매매, 박카스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몰랐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만사 모든 것을 경험했을리는 없지 않나.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더 알고 싶지도 않다. 끔찍한 세상은 오히려 피하고 싶다. 지금까지 애쓰고 살았는데 더 힘든걸 알아서 뭐하나.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알게 됐고 직접 연기까지 했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할머니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태어났을 것 아니냐. 내가 내 엄마의 귀한 딸인 것처럼. 거기까지 내몰릴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할 일이 그것밖에 없냐'고 쉽게 말하는데 내 나이가 70이다. 난 지금 연기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일반적으로 70살이 됐을 때 돈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땐 학력도 소용없다."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을거야'라고 생각해주면 그나마 양반이다. '죽여주는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죽기 전까지 몰라도 되는 일들이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인가' 생각하게 됐다. 현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다. 우울증에 좀 깊게 빠졌다.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
-죽고싶은 남자들에게는 구원자나 다름없다.
"전무송이 첫 리딩을 마치고 그랬다. '이 여자는 살인마가 아니야. 천사야' 그 말이 와 닿더라. 우리 영화는 노인 자살률을 높이는 상위 세 가지 이유를 모두 담고 있다. 중풍에 걸려 독립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치매에 걸려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면서 자존감이 파괴된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정신적 빈곤을 겪는다. 감독이 엄청나게 고민했다. 조력자라고 하지만 명백한 살인이니까."
-직접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로서 조언을 해주지는 않았나.
"조언보다는 내 해석을 말해줬다. '난 이 여자가 오래 전부터 죽고 싶었을 것 같다. 본인 아이를 입양 보낸 후 혼자는 죽지 못해 꾸역꾸역 삶을 연명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것 같다.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소영이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죽이는 것이다' 감독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라."
-죽이는 방식도 다양하다.
"그것도 엄청 고민했다. 특히 죽이고 나서의 리액션이 막막했다. 우리 중 누구도 사람을 죽여본 경험은 없으니까. 몇 날 몇 일을 생각하던 이재용 감독은 '쿨하게 죽이는게 어떻냐'고 하더라. 근데 난 암만 해도 그렇게는 못 할 것 같더라. 여자가 무력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 우는 것 밖에 없다. 이재용 감독은 울고불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감독이지만 난 울 수 밖에 없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꽃도 피고 지듯이 사람도 태어나 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은 무섭다. 병으로 죽을지, 치매가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난 죽을 날짜를 받아 놓은 사람이라면 최대한 환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법 때문에 쉽지 않은데 서양에서는 마지막에 놔주는 몰핀은 '엔젤키스'라고 한다더라. 한 환자는 피아노 레슨을 하고 싶어 했다는 사연도 봤다. 생전 자신이 가장 즐거워 했던 일을 하고 싶은 것이다. 배우가 '무대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행복하다면 행복할 수 있겠지."
인터뷰 ②에서 계속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ins.com
사진= CGV아트하우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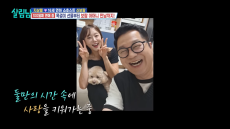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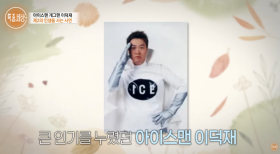

!["캐리어에 싹쓸이" 일본 관광객 몰리는 '이곳'[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1/PS26012200785B.jpg)











![[포토] 에이엠피 김신, 뽀뽀 쪽](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6.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최장신' 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7.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김신, 시크한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8.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푸처핸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5.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사랑스러운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멋진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9.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패스'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4.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귀엽게 브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2.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금발로 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1.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카리스마 작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눈빛으로 압도하는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1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패스' 피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199.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