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은퇴 위기 딛고 일어선 이해인, 씩씩했던 올림픽 데뷔전…클린 연기와 입상 도전 [2026 밀라노]
- [스포츠토토 공동기획] WBC 개봉박두…한국계 4명 류지현호 VS 빅리거 8명 이바타호
- 피투성이 되고 UFC 첫 패→폭식 “미국인들처럼 비만은 아니지 않은가”…근황 공유한 핌블렛
- [2026 밀라노] 유승은, 슬로프스타일 결선 12위…멀티 메달은 좌절
- LG 예비역 1년 차의 다짐 '이정용답게'..."직구 더 빠르게, 더 공격적으로'
- 범접 불가능한 ‘얼음 위의 펠프스’ 크로스컨트리 클레보, 대회 5관왕→통산 10번째 금메달 [2026 밀라노]
- '1등 잡아봤어?' 스웨덴 꺾은 한국-캐나다, 女 컬링 최종전 대격돌…'세계 1위' 넘어야 메달 보인다 [2026 밀라노]
- 264,082,000,000원 받고도 또 '먹튀' 위기…한때 MLB 최고 3루수, 전지훈련 중 짐 싸서 집에서 재활
- [2026 밀라노] ‘개인전 노 금메달’ 남자 쇼트트랙, 히든카드 앞세워 골리앗의 빈틈 노린다
- [TVis] 명예영국인 “남편은 英 배우, 데이팅 앱으로 만나…3년간 열애” (라디오스타)
연예
[이슈IS] 지지하거나 몸 사리거나…'미투' 바라보는 연예계 제각각 반응
등록2018.02.27 08:00

'미투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연예계 '남자'들이 모두 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성 추문 병폐에 대한 '미투 운동'을 연예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투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이다. 배우·가수·관계자 할 것 없이 '터질 게 터졌고,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공연계는 지난 25일 연극 관객들이 목소리를 냈다. 500여 명의 관객들은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연계는 성범죄자를 퇴출하라"며 여러 차례 구호를 외쳤다. 또 이들은 "더 이상 가해자를 무대 위에서 보고 싶지 않다"면서 공연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가해자의 친분만으로 불똥이 튈까 조마조마해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들에게 '성'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조금이라도 이름이 언급된다면 이미지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모든 게 조심스럽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선 아니라고 했지만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성과 관련해 정말 떳떳하지만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면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몸을 사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영화·방송계가 '미투'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아직 가요계 쪽은 잠잠하다. 이와 관련해 가요계 관계자는 "가요계는 연습생과 제작자의 관계가 복잡하다. 아이돌 연습생들이 제작자들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건을 심심찮게 뉴스에서 볼 수 있지 않나"라며 "위계와 권력이 좀 더 강한 분야라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광고계도 비상이다. 잘못 계약했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 한 광고계 관계자는 "새로운 모델과 계약 시 두려움이 앞선다. 사회적 물의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조항도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제품의 이미지다. 최대한 신중히 선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평판을 따져도 사생활은 모르는 일이라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미현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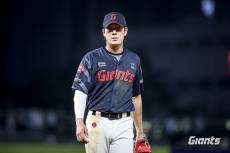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800612T.jpg)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