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일타강사’ 조정식, 문항 거래 의혹 취재에 “왜 찍냐, 치워” (PD수첩)
- 김영철, 영국 호텔 빌런 됐다... 토스트 태워서 화재 경보
- '허훈 더블 더블' KCC, 삼성 꺾고 5위 수성
- 엔믹스 ‘블루 밸런타인’, 美 팝 시장서 존재감... 6주 연속 진입
- 안영미·나비, 나란히 ‘D라인’… 둘째 임신 근황 [IS하이컷]
- “직진밖에 모른다” 24기 순자 재등장... ‘나솔사계’ 새로운 판도
- ‘천만 배우’ 유지태, 네이버 황금 트로피 인증... ‘왕사남’ 흥행 자축 [IS하이컷]
- ‘손태영♥’권상우 “뉴저지만 오면 15시간 숙면”.. 기러기 아빠 현실
- '스위퍼 포기' 좌타자 상대 슬라이더 51%…일본전 10연패 끊어야 하는 한국, 기쿠치 '공략 포인트' [WBC 도쿄]
- 대통령·장관도 축하...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한국 영화 희망 메시지 [왓IS]
축구
[황선홍 인터뷰]황새의 눈물③등번호 '18번'의 진실
등록2016.12.07 06:00

등번호 18번은 황선홍의 '트레이드마크'다.
지금 18번은 황선홍을 넘어 한국의 대표 스트라이커를 상징하는 번호가 됐다. 한국 최고 공격수였던 황선홍이라는 존재감이 만들어 낸 효과다.
한때 이동국(37·전북 현대)도 황선홍을 존경하는 의미로 18번을 단 적이 있다. 최근 한국 대표팀을 봐도 18번은 언제나 공격수의 등에 달렸다. 2014 브라질월드컵 당시에는 김신욱(28·전북)이, 2015 호주아시안컵에서는 이정협(25·부산 아이파크)이 18번의 주인공이었다.
그렇다면 황선홍은 왜 18번을 선택한 것일까. '자의'가 아닌 '타의'였다. 웃기고도 슬픈 사연이 숨어있다.
1988년 건국대 재학 시절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막내' 황선홍에게 번호 선택권은 없었다. 공격수를 대변하는 9번, 10번, 11번 등은 모두 선배들이 가져갔다. 황선홍의 차례는 가장 마지막이었고 남은 번호가 18번이었다. 황선홍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숫자다.
황 감독은 "국가대표팀에 처음 갔는데 솔직히 나도 공격수라 등번호 10번을 달고 싶었다. 하지만 선배들이 좋은 번호를 다 가져갔다. 남은 번호가 18번이었다. 내가 18번을 택한 이유는 그래서…없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대표팀에서 18번을 달고 경기를 뛰니 이 번호에 애착이 생겼다. 대학교로 돌아와서 10번이었던 등번호를 18번으로 바꿨다"며 "이후 프로와 대표팀에서 언제나 18번을 달았다. 나와 잘 맞는 번호였다. 지금은 공격수의 고유 번호가 됐다"고 만족해했다.
그의 목표는 FC 서울에 어울리는 18번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껏 서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18번은 없었다.
황 감독은 "서울 공격수는 9번(데얀), 10번(박주영), 11번(아드리아노)으로 통한다. 서울을 대표하는 18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며 "이것은 감독의 숙명이다. 발전 가능성 있는 공격수를 18번에 어울리는 선수로 키워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대표팀도 공격수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좋은 공격수를 키우는 데 욕심이 많다"며 서울을 넘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18번을 기다렸다.
구리=최용재 기자

[황선홍 인터뷰]황새의 눈물①'절망의 시대'에 사는 청춘들에게 고하다
[황선홍 인터뷰]황새의 눈물② "나는 성공한 감독이 아니다"
[황선홍 인터뷰]황새의 눈물③등번호 '18번'의 진실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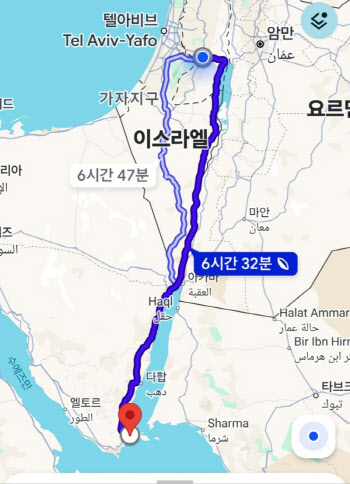











![[포토] 아일릿 원희-이로하, 팔짱 꼭 끼는 두 고양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8.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원희-이로하, 예쁜 애 옆에 예쁜 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9.400x280.0.jpg)
![[포토] 미소가 예쁜 아일릿 이로하](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5.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이로하, 앙증맞은 손가락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7.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이로하,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3.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이로하, 깜찍한 볼하트에 심쿵](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2.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이로하, 사랑의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4.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이로하, 찡긋~](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1.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이로하, 아기 고양이의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6.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원희, 저 예쁘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67.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하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70.400x280.0.jpg)
![[포토] 아일릿 원희, 고양이의 볼콕은 사랑이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6/isp20260306000066.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