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문화 수용력 10단...롯데 비슬리 "전 동료 류현진과 맞대결, 무조건 이긴다" [IS 타이난]
- '고질라' 마쓰이X'국민타자' 이승엽, 요미우리 전·현직 4번 타자 조우…무슨 일
- [TVis] 포지션 임재욱, ‘인형 비주얼’ 7살 딸 공개 (‘조선의 사랑꾼’)
- [TVis] 심권호, 간암 고백…”주변 시선 무서웠다” 눈물 (‘조선의 사랑꾼’)
- [TVis] 박서진 “여동생 나보다 인기 많아져…광고 제안 거절” (‘말자쇼’)
- [TVis] 박서진 “여동생=당뇨 초기...다이어트 약도 이겨” (‘말자쇼’)
- [TVis] “예비 시댁서 1년 동거” 며느리 평가 요구…12살 연상과 결혼 고민 (‘물어보살’)
- [TVis] ‘땡벌’ 강진 “라면 씻어 먹어…김밥도 시금치, 당근만” (‘물어보살’)
- 신동엽, “첫사랑과 결혼” 황재균 위로 “이혼은 죄 아냐” (‘짠한형’)
- 李 대통령,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에 “값진 성과, 뜨거운 축하”
야구
야구심판학교, 화제의 3인 ‘사연도 각양각색’
등록2013.01.17 18:11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전문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금·토·일요일마다 '제4기 야구심판 양성과정'(한국야구위원회·대한야구협회 등 공동주최)이 진행되고 있다. 5주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과정에서는 지난달 86명이 교육을 마쳤다.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일반 과정에는 120명의 수강생(여성은 18명)이 참가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총 1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이들은 아마야구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조교들의 시범 동작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이들이 이 곳에 모였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세 명의 '예비 심판'들을 만나봤다.
평일엔 선생님, 주말엔 학생
정혜림(29)씨는 신반포중 특수교사다.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고교 선생님이자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심판으로 활동하던 여주인공 김하늘(서이수 역)을 연상시킨다. 정씨는 "'드라마를 보고 따라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 속상하다"며 웃었다. 사실 그는 "유치원 시절에 야구로 할푼리를 배웠다"고 할 만큼 오랜 야구 사랑을 자랑한다. "이왕 시작한 것이니 사회인 야구심판으로도 멋지게 활동 해봐라"는 부모는 그에게 최고의 지원군이다. 선생님인 그는 이곳에서 '학생들의 마음'도 배워간다. 정씨는 "잘하고 싶어도 뜻대로 안된다는 걸 느낀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웃었다. 그는 "수업을 따라가면서 체력이 달려 몸도 힘들고, 살도 빠졌다"면서도 "매주 주말이 오길 기다리게 된다. 공정한 심판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최초의 심판 도전
우렁찬 목소리를 내며 "아웃"을 외치는 여느 수강생들과 달리 박대순(27)씨는 묵묵히 동작만 만들어보인다. 청각장애인인 그는 충주성심학교 시절 내야수로 뛰었지만 훈련 도중 허리를 다쳐 선수 생활을 접었다. 그는 대신 "최초의 청각장애인 심판이 돼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박씨는 "선수 시절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싶어도 의사소통이 안 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답답했다"고 돌아봤다. 선수로 활약한 경험이 있지만 "세세한 야구규칙을 모두 외우고 짧은 순간에 판단해 판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다"며 "심판님들의 자세를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의 응원도 뜨겁다. 그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첫 도전인 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꼭 도전에 성공하겠다. 지금은 내가 처음이지만, 나중에는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프로 최초 여성심판을 꿈꾼다
신세연(27)씨의 어릴 적 꿈은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시구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라운드를 밟아보고 싶었던 꿈을 심판이 돼 이루고 싶다"며 참가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직장생활(방송기자)과 심판교육의 병행이 어려워지자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야근도 불가피했다. 심판학교를 택했지만 후회는 없다"며 밝게 웃었다. 초등학교 시절 리듬체조를 6년간 배울 만큼 운동엔 일가견이 있지만 남자들의 세계로 여겨지는 그라운드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 신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도 있지만, 어렵기도 하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현역 심판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며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린지 오래다. 프로야구 최초의 여자 심판은 여전히 내 꿈이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명지전문대=김주희 기자 juhee@joongang.co.kr
평일엔 선생님, 주말엔 학생
정혜림(29)씨는 신반포중 특수교사다.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고교 선생님이자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심판으로 활동하던 여주인공 김하늘(서이수 역)을 연상시킨다. 정씨는 "'드라마를 보고 따라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 속상하다"며 웃었다. 사실 그는 "유치원 시절에 야구로 할푼리를 배웠다"고 할 만큼 오랜 야구 사랑을 자랑한다. "이왕 시작한 것이니 사회인 야구심판으로도 멋지게 활동 해봐라"는 부모는 그에게 최고의 지원군이다. 선생님인 그는 이곳에서 '학생들의 마음'도 배워간다. 정씨는 "잘하고 싶어도 뜻대로 안된다는 걸 느낀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웃었다. 그는 "수업을 따라가면서 체력이 달려 몸도 힘들고, 살도 빠졌다"면서도 "매주 주말이 오길 기다리게 된다. 공정한 심판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최초의 심판 도전
우렁찬 목소리를 내며 "아웃"을 외치는 여느 수강생들과 달리 박대순(27)씨는 묵묵히 동작만 만들어보인다. 청각장애인인 그는 충주성심학교 시절 내야수로 뛰었지만 훈련 도중 허리를 다쳐 선수 생활을 접었다. 그는 대신 "최초의 청각장애인 심판이 돼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박씨는 "선수 시절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싶어도 의사소통이 안 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답답했다"고 돌아봤다. 선수로 활약한 경험이 있지만 "세세한 야구규칙을 모두 외우고 짧은 순간에 판단해 판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다"며 "심판님들의 자세를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의 응원도 뜨겁다. 그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첫 도전인 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꼭 도전에 성공하겠다. 지금은 내가 처음이지만, 나중에는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프로 최초 여성심판을 꿈꾼다
신세연(27)씨의 어릴 적 꿈은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시구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라운드를 밟아보고 싶었던 꿈을 심판이 돼 이루고 싶다"며 참가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직장생활(방송기자)과 심판교육의 병행이 어려워지자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야근도 불가피했다. 심판학교를 택했지만 후회는 없다"며 밝게 웃었다. 초등학교 시절 리듬체조를 6년간 배울 만큼 운동엔 일가견이 있지만 남자들의 세계로 여겨지는 그라운드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 신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도 있지만, 어렵기도 하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현역 심판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며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린지 오래다. 프로야구 최초의 여자 심판은 여전히 내 꿈이다"라고 당차게 말했다.
명지전문대=김주희 기자 juhee@joongang.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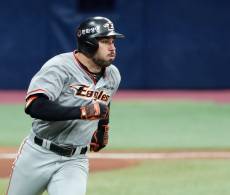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마켓인] 바이아웃만으론 부족…글로벌 PE, 사모대출 역량 다지기 박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201731T.jpg)








![[포토]채수빈, 호기심 발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12.400x280.0.jpg)
![[포토]채수빈, 작은 얼굴에 '도대체 몇등신이야?"](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11.400x280.0.jpg)
![[포토]채수빈, 미소로 주위를 밝히는 마법 시전](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7.400x280.0.jpg)
![[포토]채수빈, 수줍은 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6.400x280.0.jpg)
![[포토]채수빈, 눈빛만으로 '분위기 여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4.400x280.0.jpg)
![[포토]채수빈, 현실감 떨어지는 비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3.400x280.0.jpg)
![[포토]채수빈, 청순함 가득 담아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2.400x280.0.jpg)
![[포토]채수빈, 오늘은 하트 요정](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1.400x280.0.jpg)
![[포토]채수빈, 하트 더하기 애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200.400x280.0.jpg)
![[포토]채수빈, 팬들 선물에 함박미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99.400x280.0.jpg)
![[포토]채수빈, 청순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98.400x280.0.jpg)
![[포토]이주빈, 날씨만큼 화사한 출국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1/isp20260201000182.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