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TVis] 엄지원, 피부 관리법 “바늘로 혀 뚫어…어혈 뺄 때 쾌감” (라디오스타)
- [TVis] 김조한 “‘케데헌’ 사자보이즈 에이전트…조건 너무 깐깐해” (라디오스타)
- [TVis] 명예영국인 “英 인종차별, 미국과 달라…기분 나빠” (라디오스타)
- ‘권태성 해트트릭’ 아주대, 용인대 4-0 완파…한산대첩기 8강 안착
- [TVis] 엄지원, 눈물의 대상 소감에 “망했다 싶었다” (라디오스타)
- “엄마 이거 AI 아니야” 방탄소년단 RM, 母도 못믿는 운전 실력
- [TVis] ‘가족 절연’ 심형탁 “子 하루, 좋은 엄마 만나 행복” 눈물 (슈돌)
- “황당한 해프닝”…노진원, ‘AI 여친’ 논란 자처 후 해명 [왓IS]
- 中도 스노보드서 금메달 가뭄 끝냈다…생일 맞은 쑤이밍, 남자 슬로프스타일 정상[ 2026 밀라노]
- [2026 밀라노] 이의진-한다솜, 크로스컨트리 스키 팀 스프린트 결선행 좌절
야구
KS 우승은 팀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나
등록2016.05.25 06:00

두산은 늘 '강한 팀'이었다. 최근 10년 간 일곱 번이나 가을 잔치에 나갔다. 그 중 네 번은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최강'은 아니었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지만, 페넌트레이스 성적은 3위였다.
그런 두산이 올해는 압도적인 힘을 뽐낸다. 시즌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다. 2위 NC와 벌써 6.5경기 차.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이 대단하다. 많은 야구 관계자들은 요즘 두산을 보면서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감탄한다.
한국시리즈 우승은 어떻게 팀을 이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일까.
◇KS 우승의 선물, 자신감·넓은 시야·동료 의식
야구는 멘탈 게임이다. 우승의 가장 큰 수확은 '자신감'이다. 익숙한 말이지만, 그래서 공감이 쉽게 된다.
한대화 KBO 경기감독위원은 현역 시절 해태와 LG에서 우승을 경험했다. 별명이 '우승 청부사'였던 그는 "선수들이 우승을 한 번 하고 나면 확실히 플레이 수준이 높아진다. 포스트시즌에 뛰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지만, 우승을 경험하는 맛은 또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붙으니까 플레이 하나 하나에 여유가 생긴다"고 했다.
또 다른 '해태 왕조'의 주역 이순철 SBS스포츠 해설위원도 "한국시리즈라는 우승의 고비를 넘기면서 느끼는 자신감과 성취감은 그 어떤 경험과도 바꾸기 어렵다. 자신의 플레이에 확신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시야도 넓어진다. 박재홍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큰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인다.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상황에 집중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며 "경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내 플레이만 신경쓰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경기의 흐름을 읽게 되면, 스스로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박 위원은 "함께 우승을 일구고 나면 또 힘을 합쳐 우승해야겠다는 동료 의식이 높아진다"며 "요즘의 두산도 그렇고, 지난해까지 4연패했던 삼성도 그랬고, 2000년대 후반의 SK도 그랬다. 선수단 전체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고 덧붙였다.
◇베테랑과 유망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젊은 선수라면 한국시리즈 우승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낀다. 박재홍 위원은 20대엔 현대에서, 30대엔 SK에서 각각 우승을 함께 했다. 같은 우승이라도 의미가 달랐다.
그는 "신인 때 입단하자마자 한국시리즈에서 준우승했다. 이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기면서 2년 뒤 우승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SK 시절에는 베테랑으로 젊은 선수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다"며 "한국시리즈 같은 큰 무대를 경험한 유망주는 이듬해 페넌트레이스에서 '어, 이것 봐라' 싶은 플레이를 종종 보여 주기도 한다"고 했다.

베테랑으로 경험하는 우승에도 또 다른 느낌이 있다. 한대화 위원은 "해태 시절에는 다들 잘 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다보니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잘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1994년 LG에서는 내가 고참 선수였고,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 그렇게 우승을 하고 나니 그해의 우승에 애착이 많이 생겼다"고 털어 놓았다.
◇방심, 그리고 마운드 붕괴를 경계하라
정상에 오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다. 한국시리즈 우승 직후 성적이 곤두박질친 팀이 적지 않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두산이 그랬다. 1995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지만, 이듬해엔 사상 최초로 '최하위가 된 지난해 챔피언'이 됐다. LG는 MBC 청룡을 인수해 새 출발했던 1990년에 곧바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듬해 정규시즌 6위에 그쳤다.
한대화 위원은 이에 대해 "우승의 환희는 그 해로 끝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듬해 스프링캠프로 출발하는 순간 '우리가 우승팀이다'라는 생각을 잊어 버려야 한다. 해태 시절 4년 연속 우승도 해봤지만, 선수들 모두 매년 캠프에 가서는 싹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정규시즌에도 끝까지 해이해지지 말고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역대 한국시리즈 우승팀 중 대다수가 다음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성공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순철 위원은 "투수력이 뒷받침돼야 우승의 여운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고 했다.
롯데는 1984년과 1992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지만, 그 과정에서 에이스를 지독하게 혹사했다. 그리고 우승 이후 두 시즌 연속 포스트시즌에 나가지 못했다. 한화도 1999년 첫 우승을 차지했지만, 2000년 매직리그 3위에 만족해야 했다. 20홈런 타자를 다섯 명이나 배출했는 데도 힘을 못 썼다. 18승 에이스 정민철이 일본으로 떠나고 14승 선발 투수 이상목이 부상으로 이탈한 탓이다.
이 위원은 "두산은 새 외국인 투수 마이클 보우덴이 잘 해주고 불펜에 정재훈이라는 천군만마가 나타났다. 투수진 안정화가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더 강해진 비결"이라고 평가했다.
◇두산 전 주장과 현 주장이 말하는 우승 효과
두산은 지금 한국시리즈 우승의 효과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누리고 있다.
한대화 위원은 "요즘 두산 경기에선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공격은 둘째 치고 수비가 정말 좋다. 어린 선수들도 여유가 넘치고,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런다운 플레이에서 타구 하나로 주자 두 명을 아웃시키는 장면을 벌써 두 번쯤 본 것 같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지난해 주장이던 내야수 오재원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다. "확실히 우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선수들 표정만 봐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알아서 한다는 확신이 든다"며 "항상 1~2점차 접전을 이겨내야 강팀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승부가 타이트할 때 공격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현 주장인 내야수 김재호는 올해 한국시리즈는 물론 정규시즌 우승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두산의 자랑인 '미라클'이라는 단어와도 작별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김재호는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규시즌 1위가 아닌데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 아닌가"라며 "선수 모두가 이제는 정규시즌 우승팀 자격으로 한국시리즈에 선착해 다시 한 번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영은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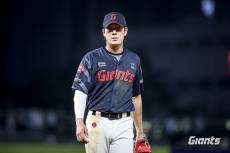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800612T.jpg)









![[포토] 티파니 영, 미소에 홀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5.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이찬원, 한터뮤직어워즈 MC 맡았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7.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우아함 종결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4.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아름다운 드레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2.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사뿐사뿐](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6.400x280.0.jpg)
![[포토] 티파니 영, 공주님 들어가십니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3.400x280.0.jpg)
![[포토] 이찬원, 팬분들 사랑해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0.400x280.0.jpg)
![[포토] 이찬원, 멋진 슈트핏](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31.400x280.0.jpg)
![[포토] 이찬원, 여유로운 MC의 입장](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9.400x280.0.jpg)
![[포토] 윤종신, 18년 만에 내는 정규앨범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7.400x280.0.jpg)
![[포토] 윤종신, 인자한 손인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8.400x280.0.jpg)
![[포토] 이창섭, 감기투혼 포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15/isp20260215000125.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