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한국인이세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성남서 석사→이탈리아 출신 자원봉사자의 여행기 [2026 밀라노]
- “이수만이 국회의원父 설득한다고”…28기 광수, H.O.T로 데뷔할 뻔 (관종언니)
-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현대캐피탈의 '스카이워크 투게더'
- "슛 쏘는 거 자체가 힘들다" 삼성 니콜슨, 5일 LG전 결장…손목 관절염 및 굴곡근 힘줄염 [IS 잠실]
- 무속인 된 정호근 “삼남매 다 신병…1년 전 여동생 사망” (특종세상)
- “이젠 정말 올림픽 분위기에요” 첫 훈련 마친 차준환의 웃음, 점프 대신 빙질 점검 [2026 밀라노]
- [영상] 로몬, '빈틈없는 완벽한 잘생김’…줌인을 부르는 비주얼
- [영상] 박지현, '예쁨의 한계 돌파’…감탄 없인 볼 수 없는 미모
- ‘김구라 子’ 그리, 전역일 ‘라스’ 녹화 도마…해병대 측 “사전 허가” [왓IS]
- [영상] 미야오 나린, ‘꽉 찬 예쁨’…나린이 미모에 한계란 없다!

문제 하나 나간다. 벙커 속에 있는 낙엽이나 솔방울 따위를 치울 수 있을까?
정답은? ‘치울 수 있다’이다. 예전에는 치울 수 없었다. 벙커 속에서 무심코 나뭇가지를 집어 들면 페널티를 받았다. 그것도 스트로크 플레이라면 2벌타나 말이다. 화들짝 놀라서 제자리에 돌려놓아도 페널티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야 ‘치울 수 있다’고 골프 규칙을 바꾸었다. ‘벙커 속에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페널티 없이 치울 수 있다’고 말이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그렇다.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란 ‘자연물이면서 단단히 박혀 있지 않고 뿌리에 붙어있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 도토리 같은 열매나 나뭇가지도 루스 임페디먼트이다. 작은 돌멩이도 루스 임페디먼트이고. 얼마나 작은 돌멩이까지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 지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그 빈틈을 교활하게 이용한 플레이어도 있었다. 벙커 속에서 작디 작은 돌멩이까지 루스 임페디먼트라고 우기면서 치워서 공 뒤가 움푹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벙커 샷을 한 악당이 나온 것이다. 패트릭 리드(Patrick Reed)라는 자이다. 이런 빈틈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규칙을 바꾼 것이라고 뱁새 김용준 프로는 생각한다.

추가 문제이다. 벙커에서 루스 임페디먼트를 치우다가 공을 움직였다면 페널티가 있을까? 낙엽 같은 것을 치우다가 공을 움직였다면 말이다.
정답은? ‘페널티를 받는다’이다. 루스 임페디먼트를 치울 수는 있다. 하지만 치우다가 공을 움직이면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니 조심해서 치워야 한다. 하필 낙엽 따위가 공 밑에 깔렸다면 치우기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공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치울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문제 나간다. 벙커 속에서 담배꽁초나 깡통 따위는 당연히 치울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Movable Obstruction. MO)이니까.
그렇다면 벙커 속에서 MO를 치우다가 공을 움직이면 페널티를 받을까? 정답은? ‘페널티가 없다’이다. 벙커 밖에서도 규칙은 같다. 대신 공은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플레이 해야 한다. 독자도 이제 벙커 속에서 치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그나저나 벙커에 깡통이 있는 경우도 있느냐고? 그랬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골프 규칙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몇 십 년 전까지 벙커는 골프장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곳이었다. 퍼팅 그린에 쌓인 낙엽은 당연히 벙커에 쓸어 넣어두었다가 나중에야 치웠다. 코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골퍼는 담배꽁초나 담뱃갑을 벙커에 예사로 버렸다. 간식으로 싸간 통조림을 먹고 깡통을 벙커에 던져버리기도 했고.
아니, 골프는 신사와 숙녀가 하는 스포츠라면서 그런 짓을 해도 내버려두었느냐고? 그 때는 벙커의 지위가 그랬다. 그래서 옛날 골퍼에게 벙커란 악몽 그 자체였다. 일단 벙커에 빠지면 한 번에 탈출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홀 가까이 붙이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다. 벙커에 하얀 모래를 가득 채워 아름답게 코스를 꾸미는 일도 그 시절에는 없었다.
이런 벙커를 위대한 천재가 바꾸어 놓았다. 지금은 전설이 된 골퍼 진 사라젠(Gene Sarazen. 1902~1999)이 골프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샌드 웨지이다. 클럽 헤드 엉덩이 부분을 두툼하게 만든 것은 진 사라젠이 처음이었다. 이 통통한 부분을 바운스(Bounce)라고 부른다.
그가 찾아낸 비결이 퍼지자 모든 골퍼가 플레이 방식을 바꾸었다. 벙커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핀을 노리고 샷을 하게 된 것이다. 파5 홀에서는 투 온을 노리는 일도 늘었고. 그에 따라 벙커도 지위를 바꾸었다. 더 이상 골프 코스 안의 쓰레기장 노릇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벙커에 백사(白沙)를 채운 것도 이 때쯤이었다. 벙커에 담배꽁초나 깡통을 버리면 매너가 없는 골퍼로 여기기 시작한 것도 그 때부터였다. 벙커 속에서 플레이를 하고 나서는 꼭 벙커를 정리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긴 것도 그 때부터였다.

그런데 요즈음 골프장 벙커는 다시 발자국투성이이다. 자신이 만든 발자국이라도 정리하는 골퍼가 민망할 정도이다. 코로나 팬더믹 시절에 고무래를 치운 것이 화근이었다. 벙커를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애초에 모르는 골퍼도 늘었고. 심지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 카메라가 비추는 벙커에도 발자국이 수두룩하다.
뱁새 김 프로는 발자국으로 어지러운 벙커를 보면서 진 사라젠이 등장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 씁쓸하다. 발자국에 들어간 공을 옮겨 놓고 플레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무리 그래도 공을 옮겨 놓고 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엄연히 골프 규칙에 반칙이라고 못을 박아 두었으니 말이다.
애독자라면 뱁새와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혹시 무심코 넘겼다면 독자부터 벙커 정리에 나서자고 부탁한다. 뱁새처럼 주위에도 독려하고 말이다. 혹시 소홀한 골프장이 있다면 따끔하게 따져 보자. 새하얀 모래가 다시 해변에서처럼 빛나게 하도록 말이다.
‘뱁새’ 김용준 프로와 골프에 관해서 뭐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지메일 ironsmithkim이다.
KPGA 프로
이은경 기자 kyong@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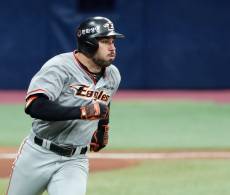







![역대급 성과급 SK하이닉스 '떨고있니'…12일 대법 퇴직금 선고[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501731T.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종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60.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민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61.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홍중](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9.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우영](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8.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산, 그렇게 쳐다보면 형 또 설레](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7.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여상](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6.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윤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5.400x280.0.jpg)
![[포토] 인사말 하는 에이티즈 성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54.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종호, 쌍 엄지척](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48.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종호, 곰돌이의 손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46.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종호, '명창 하리보'의 당당함](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47.400x280.0.jpg)
![[포토] 에이티즈 우영, 프린스의 맥박 짚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2/05/isp20260205000444.400x28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