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피보다 진한 돈? 왜 스타의 가족은 가장 잔혹한 ‘적’이 되는가 [노종언 엔터법정]
- [IS포커스] 키키, 더 강력한 ‘젠지미’로 돌아온다
-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도망가고 싶기도…후회와 반성뿐” [IS인터뷰]
- 이정후의 고백 "하나가 막히니까...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
- 닭 쫓던 개 된 '빅마켓' 다저스·양키스…메츠, 페랄타 초대형 빅딜 성사
- 보상 장벽 구축+다년계약 협상 진정성 표출...노시환 연봉 10억원 의미 [IS 포커스]
- “마지막입니다” 정주리 시아버지, 다섯째 돌잔치서 단호 선언
- ‘금융인♥’ 손연재, 새해 목표는 둘째 갖기… “2kg 증량해야”
-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없다’, 美아카데미 후보 불발
- ‘케데헌’, 美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 노미... ‘주토피아2’도 후보

지난 글 내용 중 큰 무대에 오른 젊은 투수의 긴장감을 언급했습니다. 불안감, 실패의 쓰라림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루틴, 감정의 터치를 소개했습니다. “더 알고 싶다”고 문의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어느 날, 제가 있던 야구팀 경기의 9회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대팀의 최후 공격을 막는데 주자가 쌓이네요. 살얼음 같은 리드를 지켜낼 지 홈구장 팬들과 함께 저도 ‘숨 죽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벤치에서 이동욱 감독님이 타임을 걸고 뛰어 나오네요. 마운드까지 달려 갑니다. 클로저 (closer) 원종현 선수에게 짧게 몇 마디하고 어깨 툭 치고 뛰어서 돌아옵니다.
결과는 해피 엔딩. 그런데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많은 야구팬 처럼 팀에서 일한 저 역시 마운드에서 벌어지는 대화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것도 감독이 직접 마운드에 올라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경기 마치고 감독님 방을 두드렸습니다. 싱긋 웃더니 “별거 아닙니다. 종현이 숨을 안쉬더라구요. 가서 ‘숨 좀 쉬어라, 호흡하고 던져’라고 했습니다.”
숨, 호흡.
특히나 위기, 긴장의 상황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당사자가 될 때 평상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숨쉬기를 깜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프로 선수도 그럴 정도이니까요. 야구경기 등 스포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회사 업무보고나 실적평가 과정서 상급자에게 깨질 때 어떻습니까. 어렵고, 중요한 시험을 치뤄야 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숨을 꼴깍 삼키던 제 입사 초년병 시절도 떠오릅니다. 살면서 숨 막히는 상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숨 죽이라’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비록 숨을 쉬어도 긴장과 불안으로 오히려 얕게 가쁘게 호흡하다 보니 심박수가 더 빨라져 과도한 흥분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숨쉬기를 제대로 못할 때 결과는 단순히 긴장감을 느끼는 이상으로 나빠집니다. 명상코치로 활동하는 김범진 나우코칭 대표는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이 들숨을 안쉬는 경우가 있다. 뇌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의 질은 나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영감을 뜻하는 영어단어 inspiration, 정신을 의미하는 spirit 모두 숨을 쉰다는 뜻의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역시 호흡과 생각의 깊고 오랜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호흡 관찰이다. 인위적인 호흡 훈련에 앞서 자신의 호흡을 알아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호흡이 편안한지 혹은 불편한지 그리고 그런 호흡일 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떤지를 관찰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다. 상황과 마음, 호흡의 관계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조절해 갈 수 있다.”
스포츠 과학의 관점에서는 “근력과 탄성의 차이를 줄이는 의식적인 행위가 호흡”이라고 팀42 트레이닝 센터 정연창 대표코치가 말합니다. 동아대 스포츠의학과 외래교수이기도 한 그는 “복식호흡으로 깊이 숨을 마실 때 횡경막에 공기가 깊이 들어와 단전 쪽으로 내려간다. 공기를 배 아래 집어넣고 압력이 올라가면 코어 (core)가 단단해 진다. 운동선수라면 이를 이용해 지면 반발력을 팔과 다리로 옮겨 힘을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무게를 치는 순간에는 숨을 참지만 전후로 호흡을 제대로 해줘야 큰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과학적인 이슈지만 평상심과도 밀접하기에 스포츠 선수가 되려면 종목 불문하고 아마추어 때부터 호흡훈련 부터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 숨쉬기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현명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힘들어 하는 동료, 후배, 친구, 자식에게 “긴장하지마” “편하게 해”라고 해봤자 도움말이 될 수 없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메시지처럼 ‘긴장’ ‘편하게’ 라는 말 모두 당사자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심호흡 같이 해보자”라고 해보시죠.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 김종문
김종문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1~2021년 NC 다이노스 야구단 프런트로 활동했다. 2018년 말 ‘꼴찌’팀 단장을 맡아 2년 뒤 창단 첫 우승팀으로 이끌었다. 현재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AC)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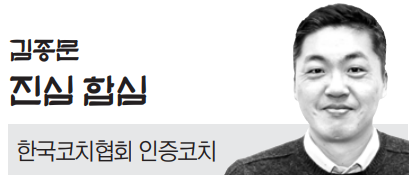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당신이 좋아할 만한정보
AD
당신이 좋아할 만한뉴스
지금 뜨고 있는뉴스
행사&비즈니스
많이 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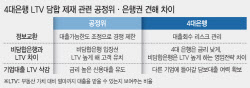










![[포토] 에이엠피 김신, 뽀뽀 쪽](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6.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최장신' 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7.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김신, 시크한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8.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푸처핸섭](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5.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사랑스러운 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3.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크루, 멋진 볼하트](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9.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패스' 무대 기대해 주세요](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4.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귀엽게 브이](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2.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하유준, 금발로 변신](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1.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카리스마 작렬](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0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눈빛으로 압도하는 분위기](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210.400x280.0.jpg)
![[포토] 에이엠피 주환, '패스' 피스~](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1/isp20260121000199.400x280.0.jpg)